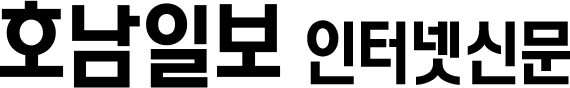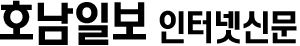조선 후기의 다성(茶聖) 초의선사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현재까지도 그의 탄생제와 다례행사가 무안 일대에서 성대히 열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초의선사가 출가했던 나주 지역의 차문화는 '조선 후기’ 이후로만 좁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에 소재한 한국명인명장연구소 허북구 소장(농학박사)는 10일 "나주의 차문화는 초의선사 이전인 고려시대부터 이미 찬란히 꽃피었다"며 "역사적 복원을 통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농어촌관광학회지에 실린 박계수·허북구 연구(고려와 조선시대 나주 금성산·금성관 일대의 음다 공간) 자료에 따르면, 나주 금성산 일대는 고려시대 팔관회(八關會)가 열린 유일한 차 산지로, 당시부터 야생차가 자생하며 제사 의식과 교류의 중심 역할을 했다.
연구팀은 금성산 자락의 복암사·심향사 등 사찰에서 제의용 차 공양과 접대차 문화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차 문화의 '맥'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금성산에는 현재까지도 약 20ha 규모의 야생차 군락지가 남아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재배가 아닌 1000년의 자연 자생차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조선 후기 다천(茶泉) 정우익이 이곳의 야생차로 다회를 열어 남도 유학자들과 교류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 문화 행사는 대체로 초의선사를 중심으로 무안 지역에 집중돼 있다.
나주는 초의선사가 운흥사(나주 다도면 소재)로 출가해 수행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고려시대 '차의 원향(原鄕)'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계수·허북구 연구팀은 "초의선사는 분명 조선 후기 차 문화의 결정적 인물이지만, 그가 태어난 무안과 달리 나주는 차의 터전이자 뿌리였다"며 "초의선사의 수행지이자 고려 팔관회가 열린 금성산 차 문화권을 함께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사례로 김해시의 '장군차(將軍茶)' 브랜드화가 주목 받고 있다.
김해는 가야시대 기록 중 '왕과 장군이 전쟁 전후에 차를 마셨다'는 사료를 근거로,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가야장군차'를 지역 특화 브랜드로 육성했다.
김해시는 가야 문화와 차를 결합한 축제, 관광 상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문화·산업'이 결합된 차 문화를 성공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주는 고려시대부터 차의 산지로 기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관광 자원이나 문화 브랜드로 적극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북구 소장은 "금성산은 차의 생산·유통·소비가 공존했던 고려의 대표적 차 공간으로, 초의선사 이전부터 형성된 나주의 차문화 전통은 한국 차 문화의 뿌리"라며 "이제는 초의선사 중심의 단선적 서사를 넘어 고려 차문화의 원류로서 나주를 재조명할 때"라고 제언했다.
호남일보 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