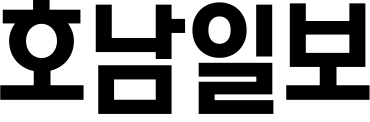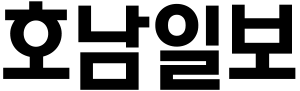호남일보 관리자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동연구팀이 자연에서 착안한 나노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복제 불가능한 보안 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GIST 정현호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와 KAIST 송영민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이 이룩한 성과다.
22일 GIST에 따르면 공동연구팀은 나비의 날개나 공작의 깃털처럼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조색(structural color)'과 '준질서(quasi-order)' 배열 구조에 주목해 외형상 동일해 보여도 내부 구조가 각기 다른 고유 광학 지문을 생성하는 보안 소자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육안으로는 기존 제품과 구별되지 않으나 고배율 광학 장비로 관찰하면 각 소자마다 고유한 산란 패턴이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른바 '광학 지문(optical fingerprint)'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면서도 디자인 손상이 없어서 고급 소비재, 의약품, 전자제품 등의 정품 인증에 적합하다.
연구진은 금속 반사판 위에 유전체(HfO₂)를 증착하고 그 위에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금 나노입자를 정전기적 자가조립 방식으로 배치해 준질서 구조의 플라즈모닉 메타표면을 제작했다.
이렇게 형성된 나노 구조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일정한 색상을 띠지만 내부적으론 복제 불가능한 무작위성을 지녀 독자적인 보안성을 갖춘다.
이러한 구조는 '물리적 복제 불가 함수(PUF-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실제 500개 이상의 PUF 키를 생성해 분석한 결과 비트 값 분포 평균은 0.501, 해밍 거리 평균은 0.494로 측정돼 매우 높은 고유성과 균형성을 확인했다. 또 고온, 고습, 마찰 등 가혹한 조건에서도 광학 지문 패턴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내구성도 입증됐다.
GIST 정현호 교수는 "자연의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구조를 나노 기술로 재현함으로써 외형은 같아도 복제는 불가능한 정보를 구현할 수 있었다"며 "고급 소비재부터 국가 보안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위조 방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IST 송영민 교수는 "이번 기술은 구조적 안정성과 복제 불가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컬러 정보와 보이지 않는 보안 키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안 인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신진 연구사업,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GIST-MIT AI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지난 8일 게재됐다.